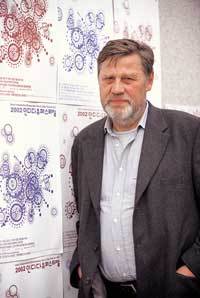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독일의 패색이 짙어가던 무렵의 브레멘. 지하실로 대피해 밤을 지새우곤 했던 소년의 마음에는 막연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사람들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걸까. 귀를 울리는 폭탄의 굉음은 전쟁을 공포의 기억으로 남겼고, 전후의 폐허에서 성장한 소년에게 오래도록 같은 질문을 되뇌게 했다. 자신의 세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현재형”이었던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치 독일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에 이른 그가 하르트무트 비톰스키다. 2002 인디다큐페스티발의 회고전에 초청돼 내한한 비톰스키는,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연로한 기색이라곤 없는 인상이었다. 든든한 풍채와 사려깊은 관찰의 태도를 잃지 않은 눈빛으로, 굵직한 저음의 목소리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라고 웃으며 자신의 영화여정을 들려줬다.
42년생인 비톰스키는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 브레멘 출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일 언어학과 연극을 전공한 뒤, 1966년 독일영화 부흥운동과 프랑스 누벨바그의 영향 아래 설립된 베를린영화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처음 8mm 카메라를 잡았다. 새로운 영화의 실험과 68혁명의 이상이 공존하던 당대의 아카데미는, 사회 참여를 고민하던 젊은 작가들의 배움터였다. 그도 이같은 토양에서 배출된 다큐멘터리 감독 중 하나. 누벨바그의 후예답게 영화를 찍는 한편 진보적 영화지 <필름 크리틱>의 발행인 겸 공동편집장을 지내고, 영화 에세이스트, 아카데미와 칼아츠 등의 교수로 폭넓은 활동을 보여왔다.
해묵은 유년의 물음을 본격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한 것은, 덴마크의 시네마테크에서 아카데미로 방출된 나치의 기록영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 80년대부터다. 나치의 선전영화에 나타난 독일의 이미지를 조합한 83년작 <독일의 영상>, 나치가 주창한 현대화의 상징이었던 아우토반과 폴크스바겐의 역사를 다룬 <아우토반>과 <폭스바겐의 제국>. 이른바 ‘독일 3부작’으로 알려진 그의 대표작들은, 나치가 기록한 독일의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영상을 교묘히 교차시키면서 독일사회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아우토반>에서는 아우토반 건설을 현대화의 업적으로 미화한 나치의 영상자료와 결국 노동자들만 착취했을 뿐 자동차 부족과 전쟁 때문에 무용지물로 남은 아우토반의 잔재를 보여주는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대화된 독일’이 허울좋은 정치적 선전이었음을 드러내는 식이다. 전투기 B-52의 연대기를 다루며 미국 자본주의의 변천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최근작 <B-52>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떤 사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를 강조하며 현실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해석을 경계해왔다.
장편 12편을 포함해 40여편에 이르는 필모그래피의 대부분이 다큐멘터리인 것도, 그런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시나리오, 예산, 배우가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극영화와 달리 그날그날 생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영화 만들기의 가장 자유로운 방식”이며,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 독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보조금, 방송사의 지원으로 조달하곤 하는 제작비 마련에 늘 곤란을 겪는다 해도, 5명 안팎의 스탭을 이끌고 거리로 나서는 작업을, 끊임없이 이미지로 가공되는 현실에 또 다른 각도의 카메라를 들이대기를 포기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카메라가 없을 땐 종이 위에다 영화를 만든다며 인터뷰 중에 생각난 아이디어를 정성스레 메모하는 그는, 아직도 영화청년의 기백을 간직하고 있는 작가다. 글 황혜림 blauex@hani.co.kr·사진 이혜정 hy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