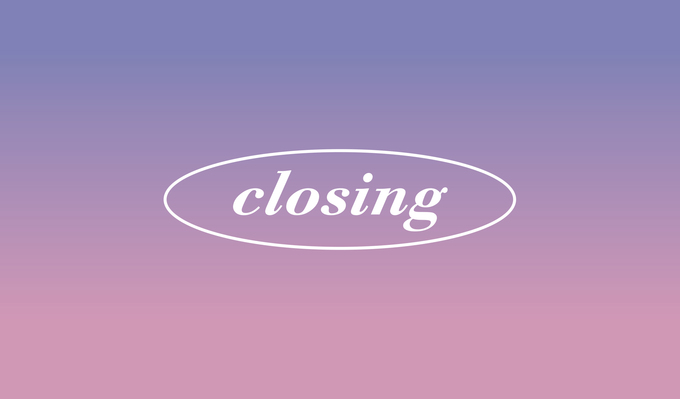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 흔히 쓰는 말이어서 굳이 우리말로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직업적 전문성 정도의 뜻이다. 전문성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다른 영어 표현(specialist, expertise)도 많아서 앞에 직업적이란 수식어구를 붙였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 능히 하나의 직업으로 삼을 만하다는 뜻도 되고, 특정 직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는 뜻도 된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염두에 두어 ‘전문직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ism’이 붙었다고 죄다 ‘-주의’로 옮기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튼 서두를 길게 끈 이유는 이렇다. 미디어에 요구되는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언지 고민하고 있어서다. 전에는 그럭저럭 뚜렷해 보였다. ‘기자’라고 하면 무엇보다 글을 바르고 간결하게 잘 써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취재 역량이 중요하다. ‘피디‘라는 직종은 기자에 비해 좀더 복합적이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자로서의 역량과 이를 구체적인 음성 영상물로 구현하는 (영상·편집기술을 포함하는) 능력 사이에서 움직인다. 여기에, 기자와 피디 사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인 ‘작가’도 있는데, 글로 표현한다는 면에서는 기자에 가깝지만, 글 이상의 음성영상적 구현에 있어서는 확연히 피디로 기운다. 이와 또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디어 직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출연자들이다. 주로 아나운서라고 불리는 사회자 혹은 앵커 역할이 있고, 패널을 구성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배우에 가까운 사람들로서 좋은 발성과 적합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추상적인 기획을 구체적인 형태로 바꿔내는 연행력(performance, acting)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대본의 구현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본인의 지식과 개성, 말 그대로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중심을 이룬다. 우리 눈과 귀에는 이들이 곧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전문성이 사실상 미디어의 직업적 전문성에 관련된 대중적 인상을 구축 한다.
기술의 발달과 시장(취향)의 변화는 기존 전문성의 내용을 파괴하고 바꾼다. 인공지능의 등장이 기자, 피디, 작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을 뒤흔들어놓을 것임에 일말의 의심도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퍼스낼리티의 전문성은 다를까? 퍼스낼리티 자체가 인격에 붙어 있는 것이기에 변화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느리게 오겠지만 어쨌든 올 것이고, 실제로 이미 와 있다. 타고난 것과 훈련받은 것의 총체로서 아무나 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발성·외모·지식·매력의 총합으로서의 연행력이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된 현실에 우린 벌써 익숙해져가고 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기성 미디어로까지 진출하고 있는 여러 신흥 퍼스낼리티들의 현실을 보면 과연 무엇이 이들의 전문성을 구성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폄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칭송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약간의 추정과 짐작 외에 ‘바로 이것이다!’라고 콕 집어 말할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명인(celebrity)이란 그저 유명하기로 유명한 이들이라 했던가? 그 각각의 이유야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꿰는 패턴을 아직 찾지 못한 나로서는,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된 심정으로 석양이 지기를 좀더 기다려야 할밖에.